공자가 말했다.
"그 직위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와 관련한 일에 대해 논하지 말라."
(자왈, 부재기위 불모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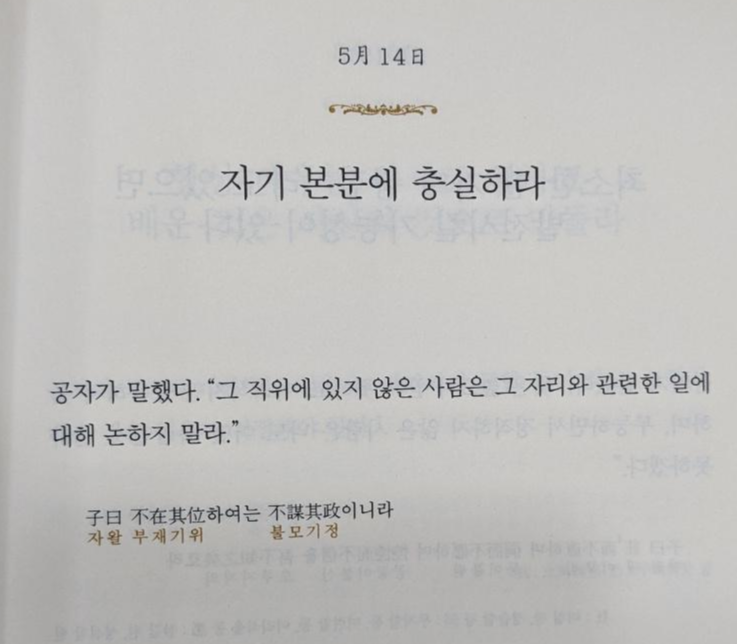
논어에 있는 공자의 말이다. 부재기위 불모기정. 선을 넘지 말라는 이야기다. 증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한다. "군자는 생각이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표현은 다르나 생각해 보면 같은 말이다. 그 자리(직위)에 있지 않으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탁상공론일 수 있고,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각기 그 자리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보편성만 들이밀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건 단순히 자기 과시요 교만일 수 있다.
장기 훈수 두는 걸 보면 고수 아닌 사람이 없다. 그러나 자기가 장기를 두면 다 고만고만한 실력이다. 그런데도 훈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자의 말이나 증자의 말이나 결국은 겸손하고 조심하라는 이야기다. 겸손하면 탈 날 일이 별로 없다. 그러나 교만하면 자주 탈이 난다. 주위를 괴롭게 한다. 항상 교만이 조직을 흩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일까? 일차적으로는 예절을 지킬 일이다. 예절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성질을 죽이는 일이다. 그러니 겸손한 것이다. 오죽하면 공자가 인을 설명할 때 '극기복례' 즉 자기를 죽여 예로 돌아간다고 했을까? 그래서 예절 교육은 인성 교육이다. 자기를 누르는 것을 익히게 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누룰 줄 모르면 예절은 없고 교만해진다.
그러나 단순히 자기를 누른다고 다 겸손한 건 아니다. 사회적으로는 자기를 누르는데 억지로 눌러서 속으로 화병이 나고 나중엔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억지로라도 자신을 누르는 것은 칭찬할 일이다. 그러나 누르려면 끝까지 눌러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끝까지 누르면 화병이 나고, 끝까지 누르지 못하면 결국은 어느 날 곪아 터진다.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다 하는데 정작 본인은 점점 더 메말라 간다. 그러다 본인이 죽건 타인이 죽건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누를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사실 억지로 끝까지 누르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화병이 나거나 폭발하거나 한다. 그런데도 끝까지 누르라한다. 이것 때문에 유교는 봉건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바른 방법은 끝까지 누르는 게 아니다. 누를 필요가 없이 스스로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 마음밭이 돼야 한다. 물론 어렵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다.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하면 부재기위 불모기정이 저절로 지켜지게 될 것이다.
겸손은 당연한 걸 감사하는 마음이다. 반대로 감사한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다. 겸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할 줄 알면 겸손해진다. 죽기 직전 구조받은 사람의 심정이 이렇다. 죽은 목숨이 구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숨 쉬는 공기도 감사하고, 마시는 물도 감사할 것이다. 죽은 목숨이 구해졌는데 뭐가 억울하고 뭐가 분하겠는가? 그런 상황조차도 감사할 뿐이지 않을까?
감사하면 주제넘게 남에게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않는다. 교만한 사람이 그런다. 조언이나 건의와 뭘 아는 척, 해본 척, 다 안다는 식의 태도와는 다르다. 기본 심성에 겸손과 감사가 있다면 같은 말을 해도 상대와 부딪히지 않는다. 자기를 죽이지 못해 부딪힌다. 정 안 되면 그저 조용히 떠날 뿐이다. 부재기위 불로기정.
사람의 수명이 이제 백 년이다. 백 년을 살면서 심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과연 10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산 것일까? 아직도 모나고 단단한 심성이니 나는 과연 무얼하며 산 것일까?




